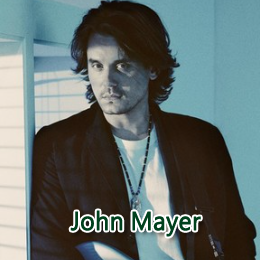심사 위원 요청이 오면 거절하지 않는 편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새로운 재능을 접할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심사를 통해 수많은 음악가를 만났다. 약간 어설픈 경우도 있었고, 이미 프로페셔널의 경지에 다다른 경우도 있었다. 아직 여물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였지만 거대한 미래가 커튼 뒤에 엿보이는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았다. 고루한 음악을 반복할 뿐인 누군가가 아쉬움을 남긴 반면 전례 없던 새로움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도 생생하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음과 같다. 좋은 음악은 지금도 어디선가 써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끔 오직 과거의 음악만을 찬미하는 사람을 목격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현재의 음악을 제대로 파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나도 알고 있다. 대중음악의 황금기는 1960년대와 1970년대가 맞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일 10만 곡 이상이 발매되는 시대다. 저 10만 곡 안에 좋은 곡이 없을 수 없다. 과거를 향한 찬미가 그저 스스로의 게으름에 대한 변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5년간 심사를 통해 알게 된 뮤지션 중 “무조건 더 큰 존재가 되겠다”라고 확신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인디를 넘어 스타가 된 한로로다. 어느덧 그녀의 대표곡이 된 ‘입춘’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 나를 포함한 모든 심사 위원이 동의했다. “스타가 될 자질이 보인다.” 그렇다. 음악만으로는 약간 부족하다. 메인스트림으로 도약하려면 음악을 넘어선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한로로에게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솔직히 뻔한 구성이다. 정형화된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묘하다. 계속 듣게 된다. 왜 그런지를 곱씹는다. 어쩌면 ‘뻔하다’라는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익숙함 속에서 약간의 새로움을 선물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배합을 지닌 음악일 테니까 말이다. 하나 더 있다. 한로로의 목소리는 꽤 앳된데 코러스 부분의 기타에는 디스토션이 잔뜩 걸려 있다. 그리하여 기타가 사납게 폭주하는 가운데 쉬이 잊히지 않을 서정미를 획득한다. 이 곡이 반응을 얻었던 가장 큰 바탕이다.

기타 연주 역시 아주 쉽다. 도입부를 보면 F-G-Am-Bb-C로 진행되는데 후렴구에서도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된다. 단, 도입부는 바레 코드, 후렴구는 오픈 코드로 연주해야 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입춘’의 주인공은 ‘우리’다. 그러나 제목과는 다르게 내용은 설렘과 거리가 멀다. 곡에서 주인공은 “아슬히 고개 내민” 자신에게 봄 인사 건네줄 누군가를 기다린다. 한로로의 말을 듣는다. “넘어지더라도 꽃피우고 싶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달라는 의도다.”
애달픈 톤으로 노래하던 한로로는 후렴구의 폭주하는 록 기타를 통해 화자의 간절함을 인상적으로 표현한다. 그가 Z세대의 록 스타로 불리는 가장 큰 바탕일 것이다.
글, 배순탁 (음악평론가,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